미국 최고 유력지에서도 선제북폭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논하는 칼럼이 게재되는 등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 정당화 담론이 날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타국에 대한 공격전쟁 바로 직전에 주요 언론 등을 통해서 대의명분을 적극 설파하는 일은 미국이 그간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서도 늘 보여온 관행 중 하나여서 동북아 긴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선제북폭의 법률적 구성요건(The Legal Case For Striking North Korea First)’ 제하 존 볼턴(John Bolton)의 기명 칼럼을 공개했다. 존 볼턴은 공격적 대외정책을 표방한 네오콘(NeoCon) 세력의 부시 2세(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유엔 미국 대사를 지낸 이다. 현재도 백악관 차기 안보보좌관 후보로 항상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강경파 정치인이자 외교관 중 한 사람이다.

존 볼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 선제타격만이 대안이다.”
존 볼턴은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은폐하는 프로파간다 공작도 함께 막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지난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강화된 포괄적 대북제재안 발표와 동시에 직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2단계 조치(Phase Two)’를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거친 해법(may be a very rough thing)’을 암시하긴 했었다”며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내용의 서두를 뽑았다.
미국 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이미 지난 1월달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핵탄두 ICBM을 완성하는데는 ‘불과 몇 개월(handful of months)’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존 볼턴은 폼페이오의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은 북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기위해서 언제까지 시간적 인내를 감내해야 할까?”라고 반문하며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존 볼턴은 선제타격 반대론자들이 그동안 북핵이 아직은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이라는 선제타격의 법적, 도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해온데 대해서 “그들은 틀렸다”라고 단언했다.
존 볼턴은 “(미국에 대한) 위협은 임박했고, 선제타격 반대론의 명제는 핵과 미사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나 설계된 기준에 불과하다(The threat is imminent, and the case against pre-emption rests on the misinterpretation of a standard that derives from prenuclear, pre-ballistic-missile times)”고 일갈했다.
이어서 존 볼턴은 “북한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로 봤을때,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북한 핵 무기가 완성된 후에 타격했을 경우에는 훨씬 위험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경고했다.
선제타격을 위한 ‘필연적 전제조건’을 제시한 대니얼 웹스터 미국 국무부 장관
존 볼턴은 계속해서 선제타격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했다. 존 볼턴은 “선제타격 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고전적 공식에 따르면, 이는 대니얼 웹스터(Daniel Webster)의 ‘필연적 전제조건(necessity)’ 시험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선제타격 시점과 관련된 국제법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했다.
대니얼 웹스터는 19세기의 미국 국무부 장관이다. 대니얼 웹스터 장관은 당시 영국이 자국의 적군이었던 식민지 캐나다 반군의 증기선인 케롤라인호를 선제타격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해를 침범했던 문제를 다루면서 한 국가의 적절한 자위권 발동 시점에 대한 유명한 국제 조약문을 작성했던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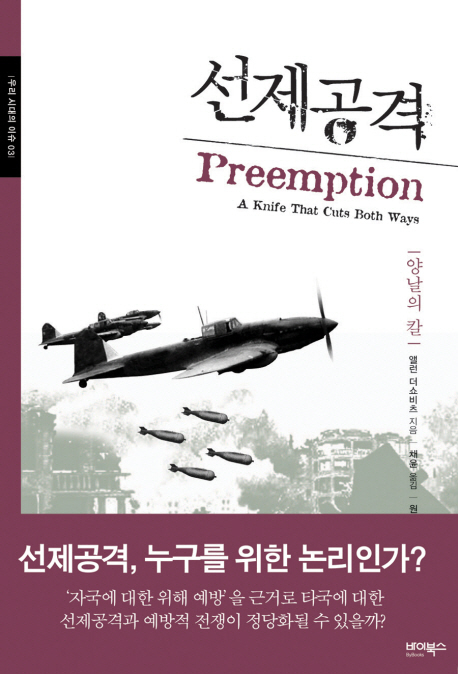
존 볼턴은 “1837년도에 영국은 미국 영해까지 침범해 들어와 증기선 케롤라인호를 격침했던 적이 있다. 이 증기선 케롤라인호는 캐나다 반군을 위해 무기를 공급하는 병참 보급선이었다”면서, “(케롤라인호 격침을 위한 선제타격 문제와 관련) 당시 대니얼 웹스터는 영국 측에게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한 필연적 전제조건인 급박성, 압도성, 대안 및 수단 부재, 숙고의 시간적 여유 부재(the necessity of self-defense was instant, overwhelming, leaving no choice of means, and no moment of deliberation)’를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단언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제타격 반대론자들은 대니얼 웹스터 국무부 장관의 ‘필연적 전제조건’ 논지에 근거해서 당시 케롤라인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영국이 캐나다 반군의 병참 보급 증기선인 케롤라인호를 (미국 영해가 아닌) 캐나다에 입항한 후에 타격했어야 한다는 식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존 볼턴은 “현재 북한 핵무기 체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이 대니얼 웹스터의 필연적 전제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체 시대에서의 필연적 전제조건과 증기 산업 시대에서의 필연적 전제조건은 같을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과거에는 먼 거리가 현재의 공간 개념에서는 가까운 거리가 됐으며, 과거에는 도착에 장시간 소요를 유발했던 발사체도 오늘날의 시간 개념에서는 수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케롤라이나호에 선적된, 영국을 대상으로 했던 무기들의 파괴력이 현재 핵 무기, 생화학 무기의 대량 살상 파괴력과는 비교가 안되는 측면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존 볼턴은 지적했다.
자국의 안보선을 영해로 국한시켜선 절대 안된다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의 교훈
이어서 존 볼턴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시간적, 공간적 환경은 군사적 위협 수준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임과 동시에, 선제타격의 정치적, 군사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도 역시 활용된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존 볼턴은 “중상주의 해상시대에는 영토 개념의 영해를 연안으로부터 3해리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면서, “18세기 초기에 실질적인 해안 외곽 방어가 가능한 포탄의 사거리로 영해로 설정했는데, 포탄 사거리가 확장되면서 대다수 유럽의 국가들이 3해리 기준을 보편적으로 적용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하지만 근대가 들어오면서 어찌 되었던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해상 방어선 개념이 무력화됐다. 존 볼턴은 “시간이 흘러 많은 국가들이 자국 관할 영해를 확장했으나, 미국만이 3해리 기준을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고수했다”고 과거 미국 안보 개념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존 볼턴은 계속해서 자국의 안보선을 영해로 국한시켜선 절대 안된다는 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의 교훈이라고 밝혔다. 존 볼턴은 “미국이 1939년도에 중립을 선언했던 이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국 영해에 대한 외부 호전 세력의 군함과 잠수함의 작전 활동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3해리 영해 기준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침략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간파했다”면서, “(미국인들이) 뉴욕과 보스턴 연안에서도 독일 잠수함이 미국 선박을 좌초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라며 긴박했던 당시 시대 상황을 소개했다.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5월 미주연합(Pan American Union) 회의에서 “추축국들(독일, 일본, 이태리)이 재해권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 확실히 패배한 것”라면서 “미국의 안보가 전광석화와 같은 현대전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도시의) 거리에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며 시기상조론을 주창하는 비판 세력을 조롱하며, “미래의 방어선 벙커힐(Bunker Hill : 미국 독립전쟁의 시초인 벙커힐 전투의 진지)은 적어도 미국 보스턴에서 수 천마일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렇게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방어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서 급기야는 대서양 오른쪽 끝인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는 물론, 심지어 서부 아프리카까지 포함시키게 됐다는 것이 존 볼턴의 설명이다.

타국 핵시설을 두차례나 선제타격한 이스라엘 모델이야말로 미국이 추구할 바
존 볼턴은 냉전 시대를 마감시킨 레이건 대통령의 사례도 제시했다. 존 볼턴은 “1988년도에 레이건 대통령도 역시 독자적으로 미국의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시켰다”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련의 첩보 수집 정찰을 위한 군함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루스벨트와 레이건은 변화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는 독자적(unilaterally)인 조치를 취했으며, 시공(時空)을 분리대립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실재적 사실에 기초한 근거를 혼동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의 안보를 지켜냈다는 것이 존 볼턴의 해설이다.
존 볼턴은 “케롤라인호 사례가 선제타격 정당성의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이는 관습적 국제법에 불과하다”면서, “국제법은 변화하는 국정(國政) 환경에 맞춰 재해석 및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존 볼턴은 현대의 이스라엘이야말로 바로 미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볼턴은 “이스라엘은 적대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번이나 선제타격을 강행한 바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의 오스락(Osirak) 핵 원자로와 북한에 의해서 건설됐던 시리아 핵 시설을 2007년에 선제타격했다”고 강조했다.
존 볼턴은 “핵 탄두를 장착한 ICBM 시대에는 이스라엘 방식이 현실에 기반한 가장 합리적인 대응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1837년도에 영국은 증기목선에 대해서도 선제타격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시전했다. 더구나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핵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선제타격이야말로 ‘필연적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안(In 1837 Britain unleashed pre-emptive “fire and fury” against a wooden steamboat. It is perfectly legitimate for the United States to respond to the current “necessity”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y striking first)”이라고 역설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선제타격조차 할 수 없는 시점이 오기 전에, 북폭결단을 내릴 준비해야
대한민국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치룰 예정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가장한 남북정상회담이 선제타격의 ‘필연적 전제조건’의 시공간적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은 없을까. 존 볼턴의 주장처럼 선제타격의 시점을 놓치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시시각각 증가하는 북핵의 위협 속에서, 수십 년째 늘 현금 퍼주기라는 귀결만 도출해온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품게 되면 자칫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김정은의 선처만을 바라는 노예의 운명으로 접어들게 만들 수도 있다. 돈 문제를 넘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아예 선제타격조차 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다.
선제타격이라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조차도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님을 미국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서 빨리 깨달아야할 것이다.

 1
1
 2
2
 3
3
 4
4
 5
5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