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사소송에 휘말릴 염려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4억5천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비판 의견을 SNS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대북송금 관련 박 의원 비판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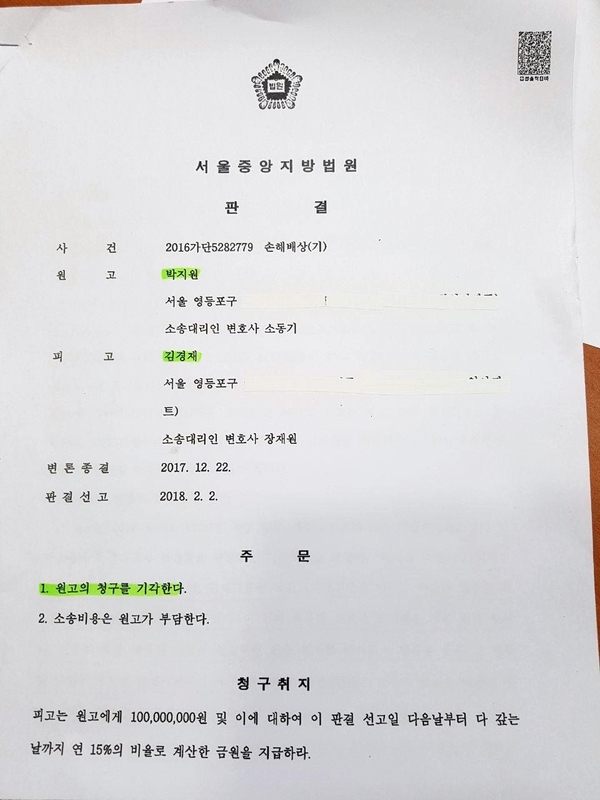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박 의원이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박 의원을 비판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김 총재의 ‘여적죄’ 발언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김 총재는 2016년 9월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집요하게 반대 선동하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김경재, "김정일에 4억5천만불 현찰 쥐어준 박지원, 청문회 세우자!")
김 총재는 “(김대중 정부 시절)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이 주도하여 산업은행, 현대그룹을 동원 4억 5천만불이라는 막대한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비밀계좌에 넣어주었다”면서 “이 돈이 핵폭탄 개발에 쓰여졌을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맹비난 했다.
김 총재의 ‘여적죄’ 발언은 박 의원이 대통령까지 협박하고 나서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왔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까지 대북송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발끈한 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 4시간 동한 나눈 대화내용을 알고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즉각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박 의원은 “원고는 대화주의자이며 종북주의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현대그룹이 북한에 최소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의 주도로 임동원 국정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이 공모한 것은 명백한 사실. 이는 대북송금 특검과 1심, 항소심, 상고심에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부분이라는 점을 법원은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라며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이런 바탕에서 김 총재의 발언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서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북송금은 결국 원고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북한측에 핵개발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원고가 대북송금의 주도자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김 총재가 북한과 박 의원의 내통을 의심하며 ‘여적죄는 사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그와 같은 의혹의 제기에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김 총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과 독대를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원고가 북측으로부터 그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원고를 정치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봤다.
결국 김 총재의 여적죄 발언은 “원고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대화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해 “원고는 공적인 존재”라면서 “그의 정치적 이념이나 발언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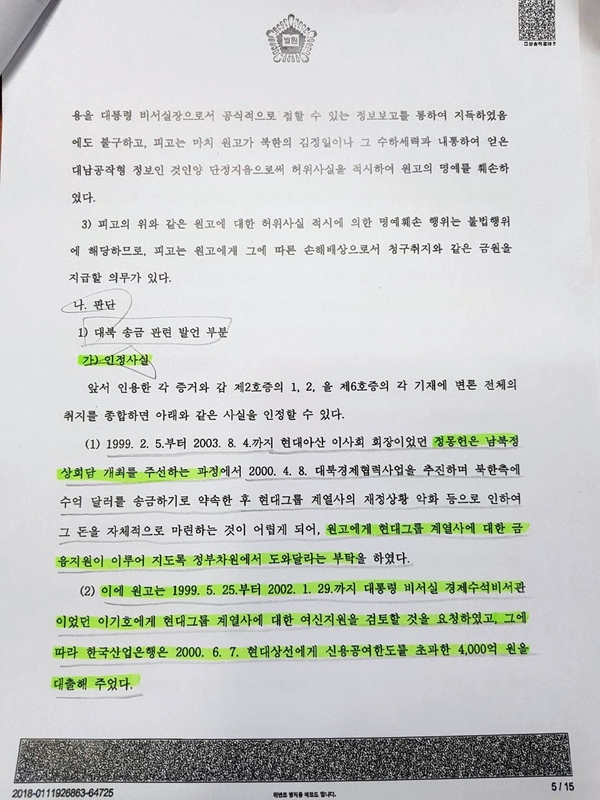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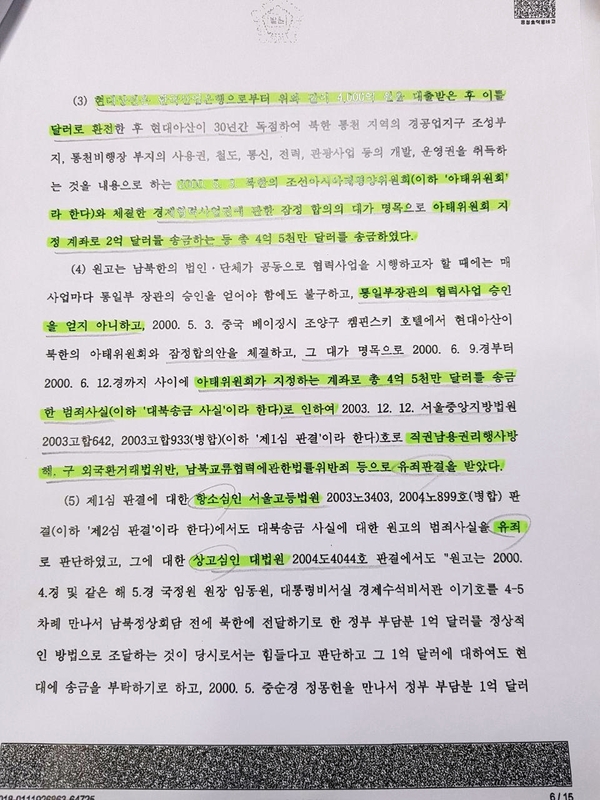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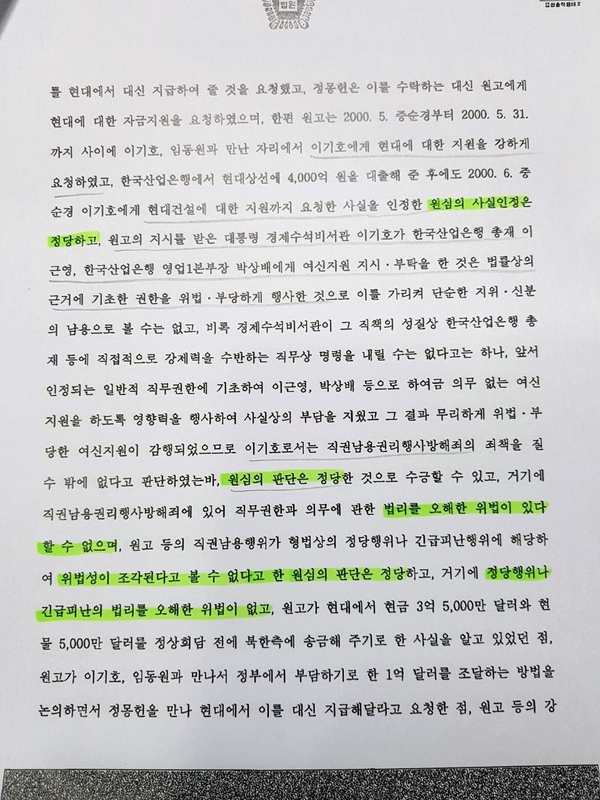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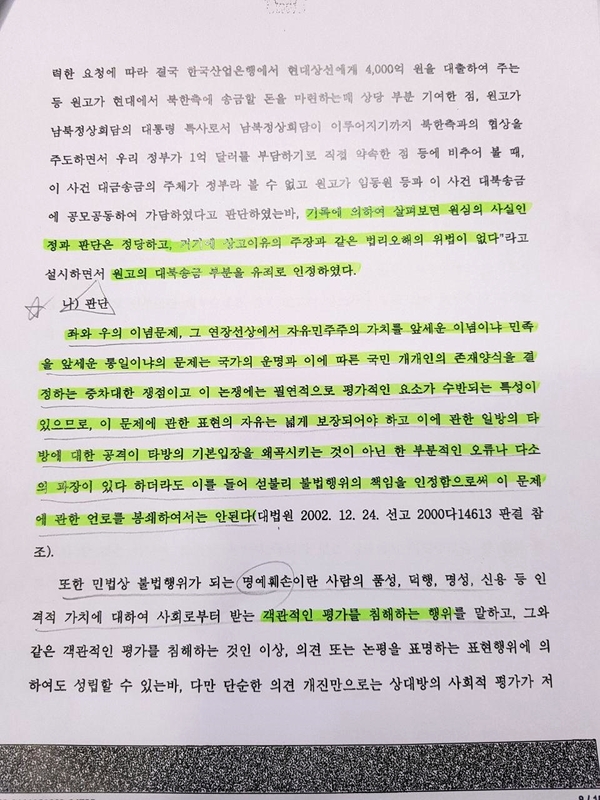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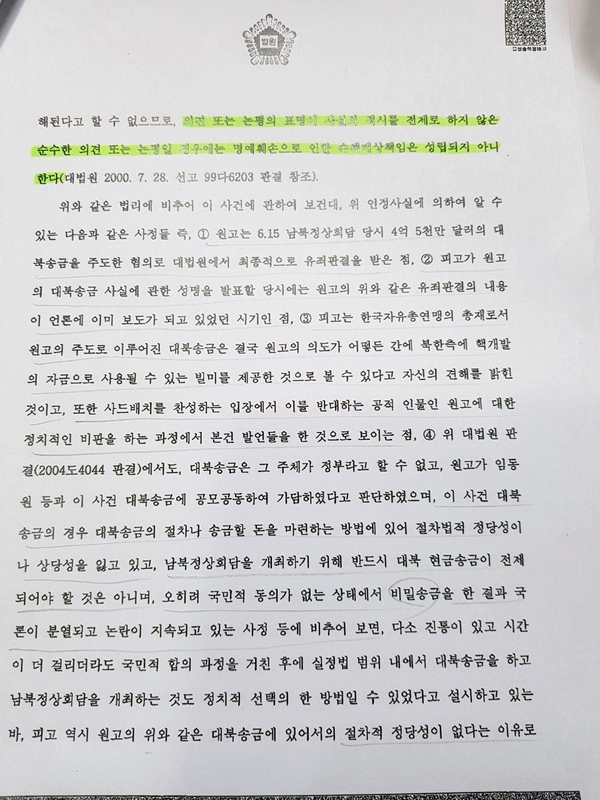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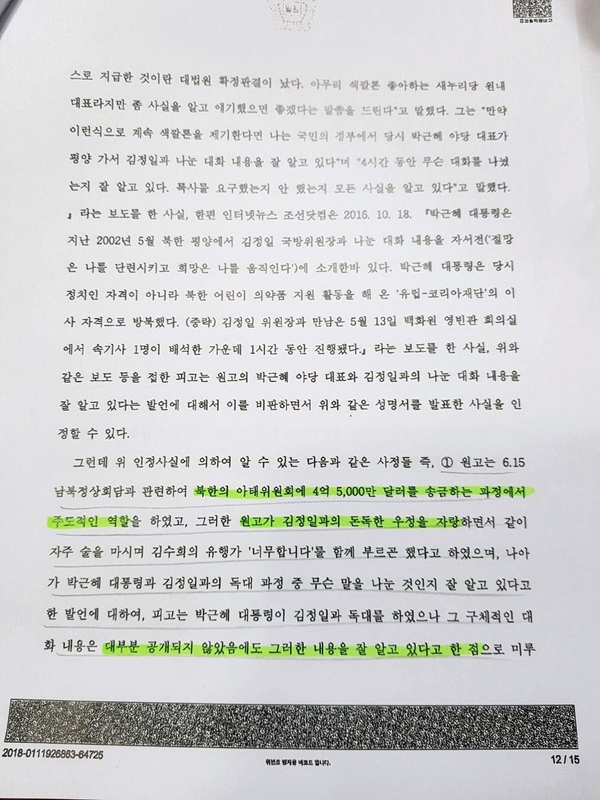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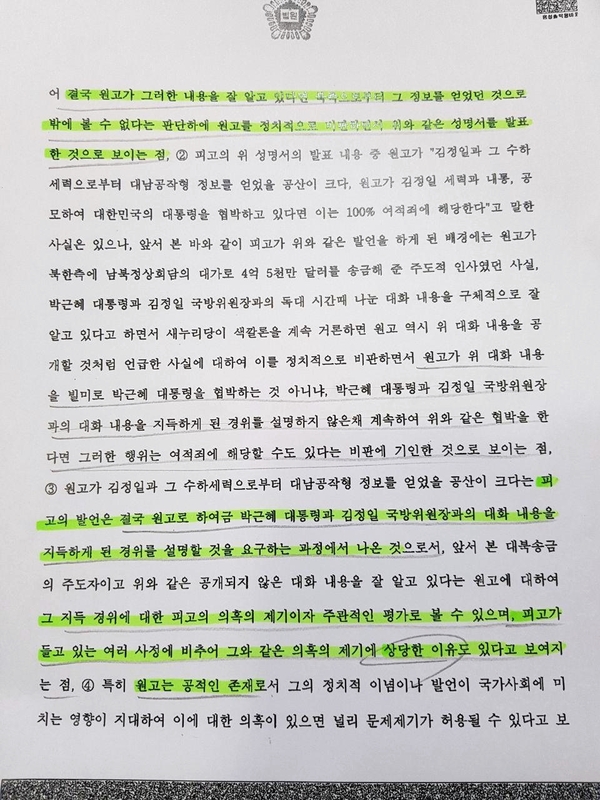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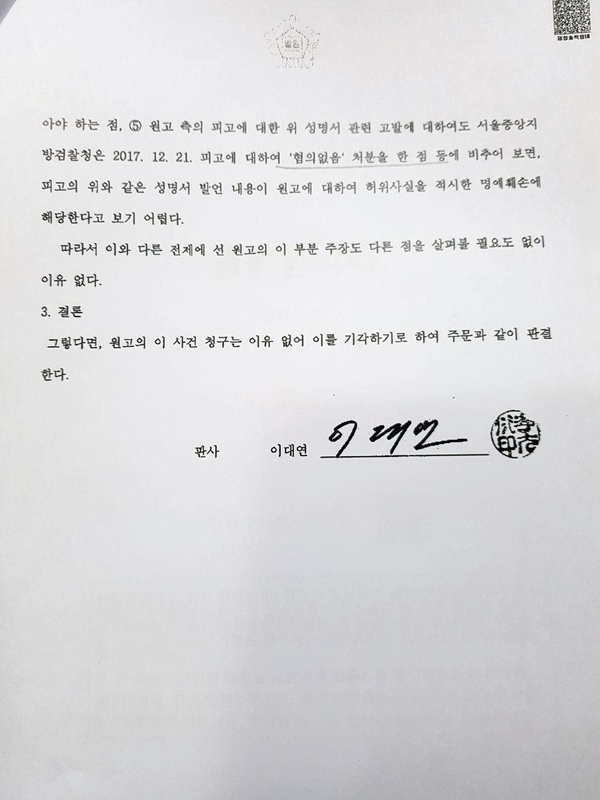

 1
1
 2
2
 3
3
 4
4
 5
5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