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역사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다. 특히 해방 이후 현대사에 관한 시각은 평행선을 달린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동일한 속성으로 이루어졌다. 현대사의 주역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분모를 살펴보자.
구인회
1907년 생
이병철
1910년 생
정주영
1915년 생
인류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 1/4은 1830년대 생 미국인들이었다. 어느 사회나 가장 큰 부자는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출현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키아는 1865년 목재회사로 설립되었다. 훗날 컴퓨터 사업을 시작한 것은 한 세기가 지난 1960년이었다. 그러나 이병철은 1952년 제당사업을 시작한 후 1969년 삼성전자를 설립한다. 그의 사업인생은 19세기형 소비재사업에서 시작해 21세기형 첨단사업으로 막을 내렸다. 압축성장의 한국현대사는 몇 세대에 걸쳐 나눠가졌어야 할 사업의 기회를 한 세대가 독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최초로 경제적 헤게모니를 잡은 후 한국경제가 한 단계씩 도약할 때마다 새로운 산업진출 기회를 남김없이 빨아들였다.
이런 결과는 뚜렷한 명암을 남겼다. 산업화의 후발주자로서 세계적 대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밝은 면에 해당한다. 하지만 더 이상 대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둠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을 천민자본가들만의 속성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이들을 아래의 인물들과 비교해 보라.
김대중
1926년 생(호적 기준)
김종필
1926년 생
김영삼
1927년 생
이들의 출생연도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해방 후 최초로 성년을 맞이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은 국가경영에 필요한 인재들이 태부족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친일파의 딱지를 피할 수 없었다. 김영삼이 스물여섯 살 나이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견제할 선배집단이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맹주의 이미지를 선점하면서 후배들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는 재벌집단과 후배들의 성장을 차단한 3김 정치는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 김대중은 세대교체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후계자는 스스로 자란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병철이나 정주영이 “중소기업은 스스로 자란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우리는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나라에는 자칭 비판적 지식인, 진보적 지식인 등 별놈의 지식인들이 다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기업 문제는 비판해도 3김 정치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김대중의 철학이 만든 결과가 오늘날 인물 없는 정당 민주당이다. 세대 간의 경쟁을 정글의 법칙에 맡겨둘 때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결과다. 이런 전통은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한명숙은 민주당의 전통을 잘 보여주었다. 그는 약자였던 이계안 후보가 제안한 TV토론을 간단하게 무시하며 한나라당보다 못한 당내 민주주의 수준을 과시했다. 이것이 이 나라 민주화세력의 참 모습이다. 붕어빵에 붕어 없고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 없다.
패륜적 패권주의
지금 우리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 가장 우려할 것은 386이라는 구태집단이다. 이들은 3김의 그늘을 벗어난 최초의 세대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특권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은 곧 3김 정치의 연장을 의미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볼꼴 못 볼꼴 다 보인 386정치인들이 삽시간에 젊은 정치인으로 새 포장 되어 등장했다. 향후에도 이들은 상당기간 젊다는 프리미엄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건 않건 간에 이미 한국사회는 또 다른 정치특권집단의 사이클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명약관화하다. 승자독식의 전통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386은 구시대의 막내들이다. 이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분야는 여지없이 세대 간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IT기업, 영화산업, 진보언론 등을 보라. 선배들에게 싸가지 없다는 평을 들은 이들은 후배들에게 더 없이 탐욕스럽고 인색한 선배들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현실은 평생 386세대의 그늘에 묻혀 지내야 하는 젊은 세대의 미래다.
더욱 끔직한 징후가 있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386세대는 자신들의 은밀한 욕망을 드러낸 적이 있다. 당시 ‘촛불소녀’로 명명된 여중생들은 진보진영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온갖 찬사가 쏟아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압권은 ‘역시 386의 자식들이라 다르다’는 것이었다. 진보진영 내에서 회자된 ‘20대 포기론’은 권력을 386세대에서 그 자식세대로 승계하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한 것이다. 학창시절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외치던 주사파다운 발상이다. 하지만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현재의 10대들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미혼모 문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엽기적인 뉴스를 접하게 된다. 만일 여기에만 촛점을 맞춰 ‘386의 자식들이라 역시 싸가지가 없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특정한 인물에 집착하는 한국적 발전모델은 자원이 한정된 후진국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월드컵에서 일본과 북한은 축구강국을 상대로 전방에 스트라이커 한명을 박아두는 소위 뻥축구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전략을 쓸 단계가 아니다. 특별한 스타플레이어 없이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스페인처럼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386패권주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은 젊은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다. 이미 십 년 전 ‘젊은 피 수혈론’이라는 명분으로 30대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사례가 있다. 타락한 386정치인들의 존재는 지금 이 사회가 새로운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세대평등이라는 화두를 고민해야 한다. 특정 인물에 의지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 모든 세대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말라 하는 정의다.
-
 1
1
[단독] 서울시 교육감 후보 6명 한자리에... 공교육 방향 논의 토론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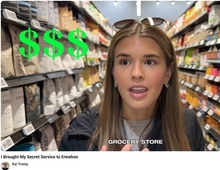 2
2
[미디어 이슈] 美-이란 전쟁에도... 트럼프 손녀 ‘사치스러운 일상’ 유튜브에 비난 쇄도
-
 3
3
[청년思] ‘공포의 수요일’이 청년에 던진 교훈... 우리가 놓친 ‘불변의 법칙’
-
 4
4
[6·3지선 여론조사] 신상진 vs 김병욱, 6·3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지지도 동률
-
 5
5
[심층분석] ‘LG家 상속 분쟁’ 구광모 승소·차명지분 의혹 해소 이끈 ‘생부’의 진술
-
 6
6
[금주의 금융 톡톡] 하나은행, 한화오션과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 맞손... BNK금융그룹, 美 이란 공습에 기업 지원책 마련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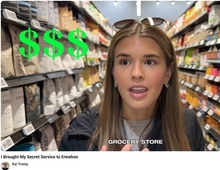 2
2
 3
3
 4
4
 5
5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