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의 내 글 "너, 갸르송 이놈!"을 읽으신 두 분의 반발이 거셌다. 나의 글이 너무 호언장담으로 비친 듯싶다. 나의 과거 언론계 친구 문창재(文昌宰)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 먼저 반기를 들었다.
“형, 여러번 전화 주셨는데 즉각 달려갈 거리에 있지 못하여 죄송했습니다. 노느라 너무 바빠서 자주 서울을 비우게 된 것 용서 바랍니다. 신나게 놀고 나서 사람노릇을 할까, 우선 사람노릇부터 하고 놀까, 이건 문제도 아닌 문제잖아요? 또 한번 죄송. 꾸벅"
"띄우신 <너, 갸르송 이놈!> 잘 읽었습니다. 허나 5년 안에 프랑스를 따라잡고 몇십년 안에 세계 2위 대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자신감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 근거라는 것도 그렇고, 설사 신빙성 있는 근거라 할지라도, 또 본인의 감상이 그렇다 해도, 파리를 극복한다는 말에는 좀 거시기한 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벌겋게 마시면서, 적나라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곧 한번 연락 올리겠습니다 4월 꽃 향기에 취한 밤에 문창재 올림"
나의 대학동기인 대학교수 조 모박사의 지적은 더 따끔했다. 변하지 않은 파리를 내가 탓한데 대해 “변화무쌍함이 변화하지 않음보다 더 우월하다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 ... 자네의 집요한 애국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일랑은 뺐으면 하네”라고 지적한 것이다.
내가 너무 나갔나?
내 주장의 옳고 틀림을 따지기 앞서, 누가 들어도 수긍할 만 한 논리적 타당성(feasibility)이 갖춰져야 했는데, 이 점에서 나는 서툴렀던 것 같다. 두 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허나 이왕 내친 김에 반론을 펴고 싶다.
마르티어 도이츨러 여사를 우선 소개한다.
나이 70 초반의 스위스 여성으로, 이조 초기 유림의 성립과정에 관한 한 우리나라 학자들도 꼼짝 못하는 한국학의 최고 대가다. 그녀가 한국학을 전공하게 된 배경도 신비롭다.
60년대 후반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유학하던 도이츨러는 같은 대학의 한 경상도 출신 한국 남학생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둘의 사랑은 그러나 남자의 돌연한 죽음으로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애인을 끝내 잊지 못한 도이츨러는 죽은 남자의 경상도 고향집을 찾아 시댁 식구가 되기를 자원한다.
전공도 아예 한국학으로 바꾸고, 시댁의 유림 학풍이 그녀의 학문적 토대가 돼, 그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가 된 것이다. 그녀는 왜 그 길을 택했을까.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허나 영안(靈眼)을 지닌 사람은 흔들리는 나무 잎을 통해 그 바람을 본다. 도이츨러는 죽은 남자를 통해 미래에 불어닥칠 한국·한국인의 바람을 본 것이다.
비슷한 시기, 갓 등장한 컴퓨터를 두들겨 본 세계인 고(故) 백남준이 “바로 이거야! 이거야 말로 한국인이 승부를 걸기 위해 만들어 진 거야!” 라고 절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백남준의 예언대로 세계 최강의 IT(정보기술)국가로 바뀌지 않았는가.
도이츨러와 백남준, 이 두 고수가 예측한 `한국 바람`이 지금의 역동성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지금 IT는 물론이고 BT(생명공학) CT(문화기술)분야에서도 세계 1∼2위권에 훌쩍 진입, 역동성의 파고 위에 올라타 있다. 그리고 이 역동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재외동포사회다. 구체적으로 재미동포사회의 자녀를 예로 든다.
하버드 예일 등 명문대학의 필수 입시과목인 대학수능고사(SAT 2)에 한국어가 내년을 기해 공식 과목으로 채택된다는 사실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버금가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또 미주 한글학교 일선에서 한글 보급을 책임진 분들 거개가 자원봉사 동포라는 사실은 재미 유대인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한국 동포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감동적인 대목이다.
이 역동성이란 말은 그러나 학자나 언론인에겐 그리 친숙한 단어가 되지 못한다.
몰가치성(沒價値性)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막스 웨버의 후예들에게 이 단어는 너무 정서적이고 감상적이며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슷한 단어 사기(士氣)의 경우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에게는 국토, 자원, 인구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 되지 않았던가.
또 같은 학문의 세계라도 신학자 칼 발트의 경우 “왼 손에는 신문, 오른 손에는 성경!” 을 강조했다. 신문기사를 통해 성서적 진리의 구현을 확인하고, 성서를 읽되 신비에 빠지지 말고 기사의 팩트(사실)처럼 읽으라는 취지에서다.
교민을 보는 우리의 눈도 차제에 팩트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과거처럼 더 이상 기민(棄民)이 아니다. 하나님이 용도를 갖고 세계 도처에 숨겨놓은 7백만의 `남은 자(remnants)`로 나는 보는데, 지금 꿈틀대는 저 역동성이야말로 바로 그 용도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내가 15년 만에 들른 파리는 지금의 우리 역동성과 너무 대조를 이뤘고, 그러다 나한테 애꿎게 징(釘)을 맞았을 뿐이다.
/ 빅뉴스 포럼대표
-
 1
1
[6·3지선 여론조사] 신상진 vs 김병욱, 6·3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지지도 동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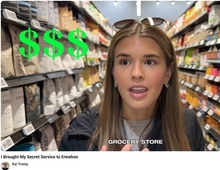 2
2
[미디어 이슈] 美-이란 전쟁에도... 트럼프 손녀 ‘사치스러운 일상’ 유튜브에 비난 쇄도
-
 3
3
[심층분석] 6·3지선 성남시장 후보 여론조사... ‘수정구’는 신상진 vs ‘분당·중원구’는 김병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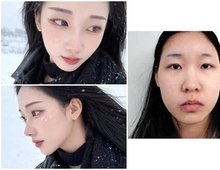 4
4
[미디어 이슈] ‘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 보도, 외모 품평 부추기나
-
 5
5
[금주의 화장품·패션 톡톡] 삼성물산, 佛 4개 브랜드 국내 독점 판권 확보... CJ올리브영, 美 서부 물류센터 구축
-
 6
6
BTS 컴백 맞이 유통·미디어 업계 ‘총력전’... “BTS 대목 노린다”
-
2026-03-14 15:06
[금주의 식음료 톡톡] SPC삼립, 신임 대표이사 인사... 농심·오뚜기·팔도, 일부 제품 내달 출고가 인하
-
2026-03-14 14:20
[금주의 제약·바이오 톡톡] 한미약품, 첫 외부 영입 인사 대표 선임... 종근당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국내 품목허가
-
2026-03-14 13:19
현대차 팰리세이드 美 ‘전동시트 끼임 사고’에 일부 사양 판매 중단
-
2026-03-14 12:30
[금주의 금융 톡톡] 신한·우리은행 중동 지점, 美·이란 전쟁 공포에... 하나금융, 주총 안건 안정적 통과 전망
-
2026-03-14 10:15
[심규진 칼럼] 왜 장동혁이어야 하는가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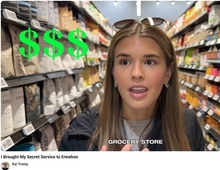 2
2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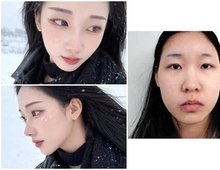 4
4
 5
5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