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내가 평소 아름답다고 여기는 친구 가운데 하나다. 수년 전 조선일보가 주관한 동인문학상에 이 순신(李舜臣)을 소재로 쓴 소설 《칼의 노래》로 입상한 작가 겸 언론인 김 훈이 바로 그다.
그와는 한국일보 기자로 20여 년, 또 시사저널 을 창간하며 6년 남짓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그는 늘 폐부를 찌르는 글로 나를 감동시켰다. 흡사 제 인육(人肉)을 맷돌에 갈아, 거기서 나오는 즙을 잉크 삼아 써대는 글이 김 훈의 글이다. 80년대 그가 한국일보 문화부 문학전담 기자로 장기집필한 문학기행은 타 언론사에 근무하는 문화부 기자들의 필체를 송두리 채 바꿔놓을 정도로 기찬 글들이었다.
취재 장면 하나 하나를 그는 어느 시인도 엄두 못 낼 절대음감으로 묘사해냈다. 하다못해 취재 길, 그가 탄 기차의 차창(車窓)밖으로 명멸하는 원경(遠境)의 야산(野山)마저도 그의 펜이 닿으면 "순한 짐승처럼 꾸벅꾸벅 따라 오는 산(山)들"로 둔갑한다.
생김새도 헌칠했다. 늘씬한 키에 사려 깊은 눈매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그 입술…" 을 쓴 시인 고(故) 박 인환을 그대로 닮았다. 어쩌다 주기(酒氣)가 오르면 그의 아름다운 눈은 화장 발이 잘 받는 30대 여인의 얼굴처럼 그렇게 환히 빛난다.
진한 표현을 즐겼고, 그 표현들이 대개는 허황된 것이지만, 그 표현 하나 하나를 입이 아닌 눈으로 전할 만큼 매력적인 눈을 가진 문객이었다. 노래도 잘했다. 끝 대목이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는 유행가를 즐겨 불렀는데, 부르고 나면 으레 나름의 음운론을 폈다.
그 노래의 핵심은 첫 대목 "연분홍 치마…"의 '∼마' 에 있다며 <마!> 소리를 다시 한번 크게 발음했다.
이어 '알뜰한 맹세' 대목으로 넘어간다. (노래 속의) 사내자식은 분명 못난 3류였다 는 것이다.
그 못난 놈이 작별하며 내년 봄 이 맘때 꼭 데리러 올 테니…어쩌구 저쩌구 했다는 것이다.
여자는 오직 그 맹세 하나를 지키느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밤 제비 날라드는 서낭당 길" 만 허발 나게 오가며 사내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봄날은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 훈은 이렇게 말한다. "형! 참 이상해요, 잘 난 년일수록 이런 3류한테 잘 빠진단 말예요"
허나 실은 여자도 알고 있다. 사내의 그 잘난 맹세가 얼마나 허황되고 알량한 것인지를.
그러나 기다림은 직접 당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기다림에 지치다 보면 그 알량한 맹세마저도 알뜰한 맹세로 바뀌고 만다며, 또 바로 거기에 슬픔이 있다며, 김 훈은 예의 슬픈 눈빛을 지었다.
따라서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면 '알뜰한 맹세'를 '알량한 맹세' 로 해석해서 부를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그 때마다 나도 안다. 그가 단순히 봄날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봄날을 타령하되 정작 말하려는 건 그가 이미 버리거나 아니면 제게 버림을 준 여인들을, 또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는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 승웅 저 "모든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에서>
빅뉴스
-
 1
1
[6·3지선 여론조사] 신상진 vs 김병욱, 6·3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지지도 동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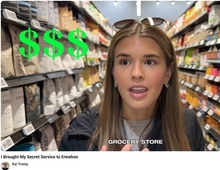 2
2
[미디어 이슈] 美-이란 전쟁에도... 트럼프 손녀 ‘사치스러운 일상’ 유튜브에 비난 쇄도
-
 3
3
[심층분석] 6·3지선 성남시장 후보 여론조사... ‘수정구’는 신상진 vs ‘분당·중원구’는 김병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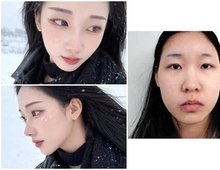 4
4
[미디어 이슈] ‘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 보도, 외모 품평 부추기나
-
 5
5
[금주의 화장품·패션 톡톡] 삼성물산, 佛 4개 브랜드 국내 독점 판권 확보... CJ올리브영, 美 서부 물류센터 구축
-
 6
6
BTS 컴백 맞이 유통·미디어 업계 ‘총력전’... “BTS 대목 노린다”
-
2026-03-14 15:06
[금주의 식음료 톡톡] SPC삼립, 신임 대표이사 인사... 농심·오뚜기·팔도, 일부 제품 내달 출고가 인하
-
2026-03-14 14:20
[금주의 제약·바이오 톡톡] 한미약품, 첫 외부 영입 인사 대표 선임... 종근당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국내 품목허가
-
2026-03-14 13:19
현대차 팰리세이드 美 ‘전동시트 끼임 사고’에 일부 사양 판매 중단
-
2026-03-14 12:30
[금주의 금융 톡톡] 신한·우리은행 중동 지점, 美·이란 전쟁 공포에... 하나금융, 주총 안건 안정적 통과 전망
-
2026-03-14 10:15
[심규진 칼럼] 왜 장동혁이어야 하는가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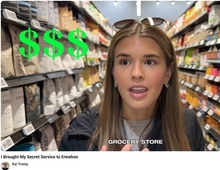 2
2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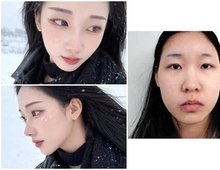 4
4
 5
5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