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다음 측의 한 관계자와 만났을 때, 필자는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미디어다음이 아무리 공정하게 뉴스편집을 하고자 해도, 미디어다음의 사업에 불리한 뉴스가 메인에 갈 수 없지 않냐고 필자가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사례로 필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재웅 전 대표가 바다이야기 관련 300억의 뇌물 수수를 받았다는 SBS 뉴스 기사를 들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놀랍게도 이를 동영상 뉴스 메인에 배치했다. 그러나 역시 이 기사는 3시간만에 사라졌다. 미디어다음 측이 당시 기사를 숨긴 이유는, 이재웅 대표가 SBS를 상대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필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포털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사람들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기사를 내렸던 말인가. 이재웅이라는 다음의 대표와 관계된 기사니까, 내린 것 아니냐"
이때 미디어다음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늘 언론에서, 아나운서 노현정씨와 현대가의 정대선씨의 이혼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네이버는 이 기사를 전체 뉴스 메인에 배치하기도 했었다. 인기검색어도 1위에 올라갔다. 그러자 곧바로 현대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매체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밝혔다.
네이버에서는 메인은 물론 연예면에서도 관련 기사가 사라졌다. 반면 노컷뉴스의 김대오 기자의 무차별적 이혼 기사를 쏟아낸 언론을 비판하는 칼럼을 주요기사에 배치했다. 노현정의 과거 남자 논란이 있을 때, 네이버 측은 인기검색어를 차단하며, 네티즌들의 집중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때 네이버의 논리는 "현대측으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네이버에서 현대가의 법적 대응이 발표되자마자, 노현정 관련 기사를 모두 감추고, 반박 기사만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현대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가? 네이버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 명예훼손 혐의가 짙은 기사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지만, 언제 네이버가 인권을 위해 그토록 세셈한 배려를 했었던가? 검색중단이든 관련 뉴스 은폐든, 일반 사람은 연락조차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놓은 게 네이버의 시스템이다. 힘있는 자는 언제라도 핫라인을 통해 검색과 뉴스편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힘없는 자는 일방적으로 당해야 한다.
반면, 미디어다음은 연예뉴스 메인에 노현정 이혼관련 기사를 집중 배치했다. 자사의 대표의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마자, 곧바로 뉴스를 감추었던 미디어다음이, 노현정에 대해서는 관련기사로 묶어버린 것이다. 왜 자사의 대표와 일반인에 대한 뉴스편집의 기준이 다른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으면 바로 내려야 하지 않은가. 만약 이재웅 대표와 아나운서 황현정의 이혼설이 논란이 될 때, 미디어다음에서 이를 메인에 배치할 자신있는가.
필자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미디어다음의 노현정 관련 기사를 다 내릴 수 있다. 미디어다음의 책임있는 사람이 필자에게 분명히, 법적 소지가 있는 기사는 내린다고 자신들의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당신 그때 그렇게 말햊놓고, 왜 원칙을 저버린 편집을 하는가" 이렇게 따져물으면 기사를 내려야지 별 수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자가 권력자는 아니지만 포털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현대가에서 네이버에 검색어 삭제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권력으로 포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웅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를 3시간만 내려버린 것도, 그의 권력이다. 일반인들은 불공정한 뉴스편집에 피해를 입어도, 뉴스책임자와 연락조차 하기 어렵다.
포털의 뉴스편집은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이 불투명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면, 힘있는 자는 얼마든지 기사를 올리고 내리지만, 힘없는 자는 클릭수 장사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향후 미디어다음의 관계자를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 또 한번 따져묻겠다. 대부분의 포털사 임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그때 왜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화 했으면 바로 처리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답한다. 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다. 포털 피해는 포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그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자신이 없으며, 뉴스편집 이제 그만 좀 포기해라. 아니면, 차라리 "원래 뉴스편집은 그런 것 아니냐. 우리만 그러냐, 언론사는 더 심하지 않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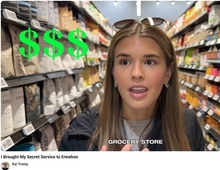 1
1
 2
2
 3
3
 4
4
 5
5
 6
6
